시키는 일만하는 조직문화 답답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
북핵 우리 스스로 해법찾기보다
G2에 기대는 패배주의 등 꼬집어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순간 중국이 인식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줄어들게 된다” “삼성이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혁신을 가져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로 30년동안 미국 학계에서 한반도와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기욱 교수의 조언이다. 신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한국의 이면을 예리하게 짚어낸다. 도움도 안되는 ‘반미’ ‘친미’의 식상한 프레임에 갇혀 냉정하게 현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
| “한국이 ‘넥스트 코리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지 폭넓게 짚어보고자 했다.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거쳐 찾아낸 해법과 가능성을 담고자 했다.”(‘슈퍼피셜 코리아’에서) |
신 교수는 “군사나 안보 면에선 미국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국의 부상,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때 ‘배를 갈아탈 타이밍’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며, “이러한 논리는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을 호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 교수가 지난 30년간 미국의 중심에서 고국에 대해 느낀 생각과 고민, 2015년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머문 경험을 담아 ‘슈퍼피셜 코리아’(문학동네)를 펴냈다. 제목처럼 그의 눈엔 한국사회는 얼핏 역동적이고 분주해보이지만 실은 피상적이며 가치를 상실한 사회로 비쳐된다.
무엇보다 현재 다급하게 흘러가는 동북아정세를 보는 그의 눈은 안타까움으로 가득차 있다. “북핵 문제만 해도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주길 바라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고 답답함을 드러낸다.
그는 이런 현실에 맞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식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며, ‘돌고래론’을 제시한다. 즉 한국은 더 이상 고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새우가 아니며, 고래와 이해관계가 있는 돌고래로, 몸집에 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명, 중추적 중견국가, 미들파워 외교다.
신 교수는 2015년 사드배치를 놓고 벌어진 주무부처간의 한심한 태도가 얼마나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을 실소케 했는지도 들려준다. 한마디로 정치외교 전략의 부재다.
성장동력을 상실한 한국 경제의 원인을 실리콘밸리의 시각으로 지적한 내용도 뼈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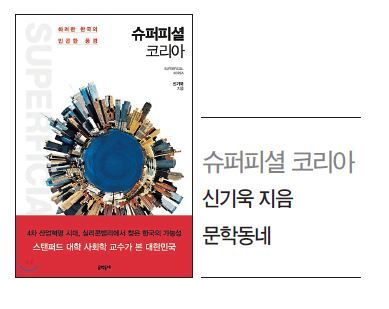
저자는 갤럭시가 나오기 직전 삼성의 한 고위임원과 나눴다는 얘기를 들려준다. 당시 그 임원은 “우리도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어떨게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그 방향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했다. 삼성의 패스트 팔로어 전략은 적중했지만 앞으로는 퍼스트 무버, 트렌드 세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혁신은 흔히 기술에서 나온다고 여기지만 문화에서 나온다는 말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다양성 문화다. 미국에선 기업 채용이나 대학교수 임용, 대학 입학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다양성 확보로 ‘다양성 책임자’를 두고 있다는 것. 다양성이 혁신을 초래한다는 건 연구결과로 나타난다.
한국기업들도 최근 외국 인재 채용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은 얼마 못가 퇴사를 한다. 아이디어를 내놓기 힘든, 튀지 말고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기를 바라는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다. 저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결국 교육과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창조적 파괴자를 찾는 일 뿐 만아니라 파괴를 반갑게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동시에 일궈나가야 한다”는 것. 순혈주의, 순응주의 체력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말이다. .
저자는 대안으로 개발도상국과의 인적 교류를 강조한다.학생 교류를 통해 문화적 기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에는 저자가 한국에 머물며 경험한 일상에 대한 따가운 지적도 많다. 나만 네트워크에서 소외될까봐 전투적으로 약속을 이어가는 한국의 피상적인 인간관계, 자극적인 것을 끊임없이 찾아나서는 너무 바쁜 한국, 방향을 잃은 이상한 스펙 인플레이션, 규제는 너무 많은데 처벌은 느슨한 법, 개인을 감시하는 CCTV에 무감각한 한국인 등 외국인 아닌 외국인으로서 그가 본 피로사회,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를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고ㅘ 나누고 싶었다”며, “내 시각의 한계가 오히려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희망적인 생각”에 책을 냈다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